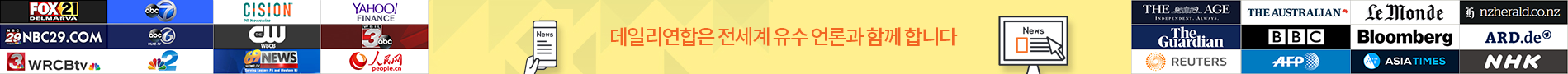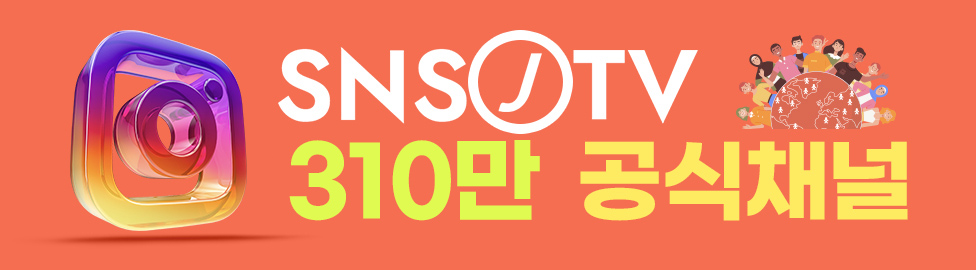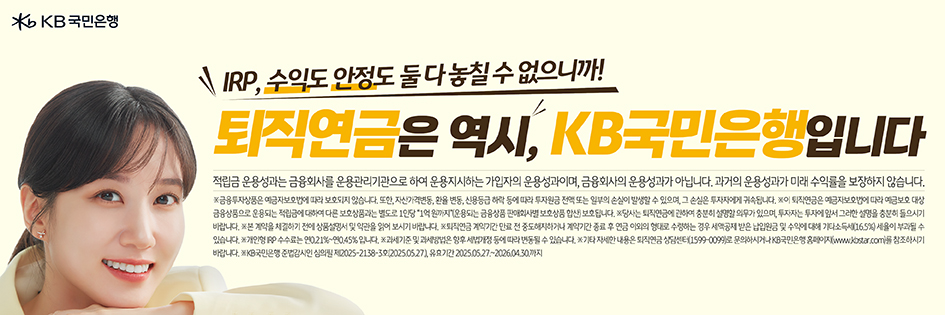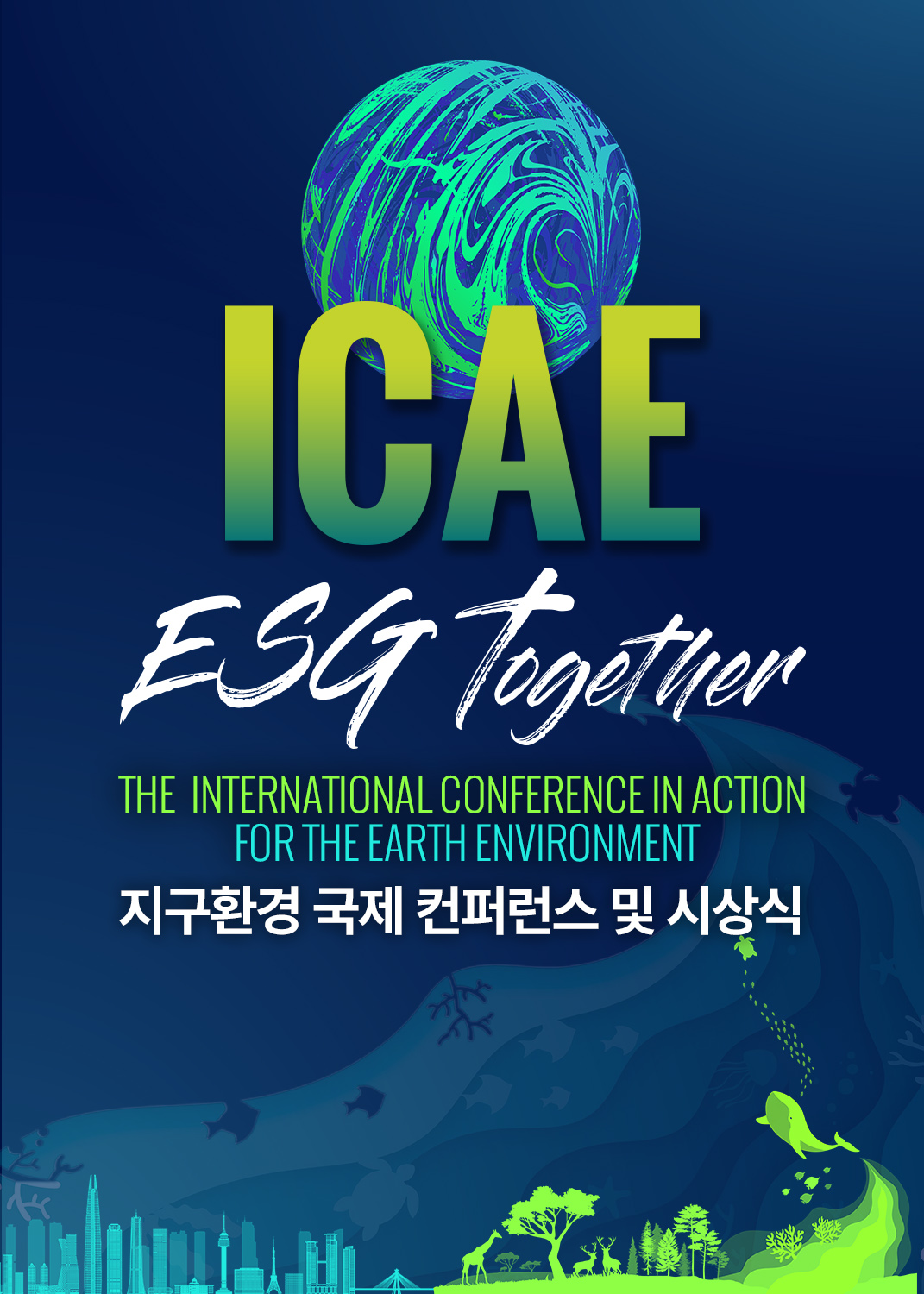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이상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당신의 연금, 안전할까?"
국민연금 고갈론은 무너진 출산률과 초고령화 기조에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수익의 핵심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률은 0.72로 또 한 번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필사의 고민으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계엄 등 혼란한 정치 공방에 정신이 없다. 형식적으로나마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겠다고는 했지만, 진정성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시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MZ, 청년세대의 미래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②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미래 안전 자산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또한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1.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소득에서 내야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총보험료는 2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18만 원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근로자는 9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월 소득 : 2,000,000원
- 총 보험료 : 2,000,000원 × 9% = 180,000원
- 근로자 부담액 : 2,000,000원 × 4.5% = 90,000원
- 회사 부담액 : 2,000,000원 × 4.5% = 90,000원
정부의 개역안대로 12%로 인상 시, 근로자는 12만 원 납부
- 월 소득: 2,000,000원
- 총 보험료: 2,000,000원 × 12% = 240,000원
- 근로자 부담액: 2,000,000원 × 6% = 120,000원
- 회사 부담액: 2,000,000원 × 6% = 120,000원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커진다. 물론 국민연금 수익을 높여 추후 연금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겠지만, 당장 한푼이 아까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인다고 할 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것은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노후는 더욱 가난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에는 70%로 설정됐으나, 이후 재정 안정화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는 40%로 조정됐다.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소득대체율 = (연금 수령액 ÷ 생애 평균 소득) × 100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매월 받는 연금액이 80만 원이라면, 소득대체율은 (80만 원 ÷ 200만 원) × 100 = 40%가 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명목적인 수치다. 한 사람이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 동안 꾸준히 한 달도 빼먹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생애 평균 월 소득이 200만 원이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이유로 많은 가입자가 40년은 커녕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경제불황과 AI 도입 등 노동시장 기계화, 직업 인식의 변화 등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9.2년으로 추정, 명목 소득대체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해했다.
재정계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40%)를 유지하면 평균 가입 기간이 약 10년 늘어도 급여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 입장에는 우울한 얘기다.
비교적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2025년에 연금을 받게 될 현 60대의 실가입기간은 평균 19.2년이지만, 연금액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대비 27.0%에 달한다.
반면, 2050년 이후 연금을 받게 될 2030세대는 가입 기간이 24~27년으로 5~8년을 더 가입하고도 연금액은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26~28%로 현 60대와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버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와 노동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큰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총체적 난국인 '연금개혁'... 다른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연금개혁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그 외의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
가입 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42%는 40년간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미만으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치보다 낮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나 경력 단절 예방 등의 정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
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 비중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시켜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모두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혁이 정말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노동 인식 변화와 개인의 연금 선택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이제 공적 연금 종류의 다양화, 개인연금 활성화 등 국민연금 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외에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가 있어 보인다.
다음 보도에서는 2030, MZ세대의 입장에서 노후를 위해 실질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할 지 살펴볼 예정이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