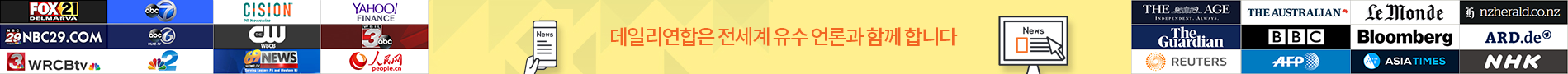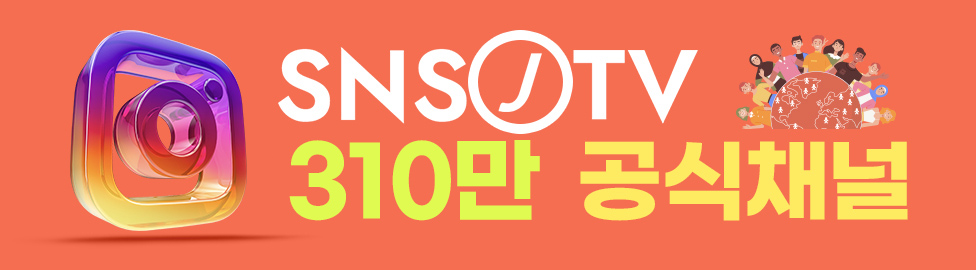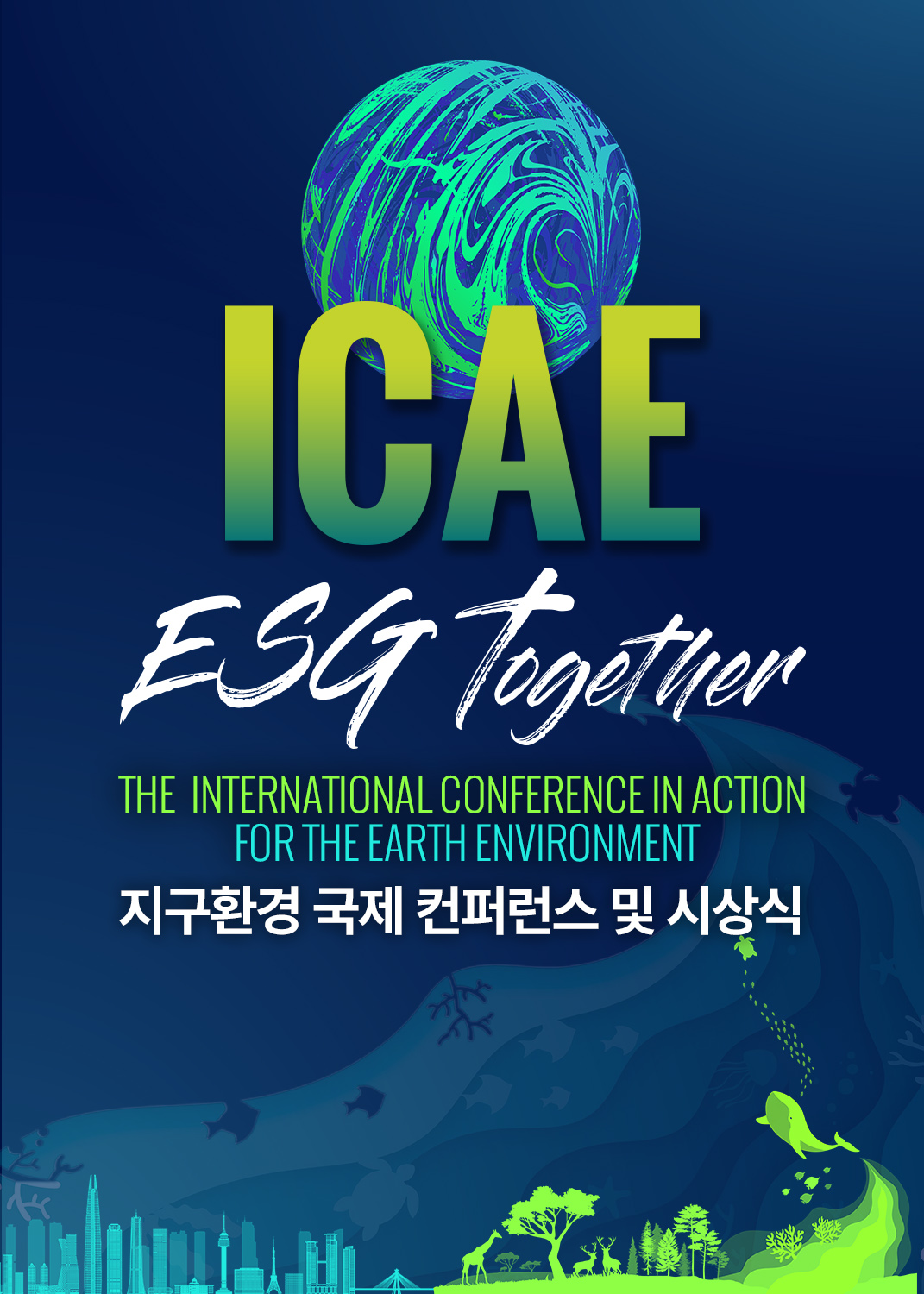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 고묘황후, 1944년 기쿠치 게이게쓰(菊池契月) 작
일본에는 전국 13개의 국립한센병요양원이 있는데, 오카야마(岡山)에 위치한 국립요양원의 이름이 광명원(光明園)이다. 1300년 전, 나라시대 45대 쇼무(聖武) 천황의 부인 고묘황후(光明皇后, 701~760)의 설화에서 그 이름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8세기 한반도에서 전파된 불교와 대륙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시대에 불교의 후원과 융성에 힘쓴 고묘 황후의 ‘시욕설화(施浴說話)’가 그것이다.
천재에 의한 대기근과 천연두 확산 등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묘황후는 부처님의 자비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화사(法華寺)에 욕실을 설치하고 귀천을 불문한 천 명의 더러움을 씻어주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실천한다. 그런데 1000번째 찾아온 마지막 손님이 중증의 한센병 환자라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도 황후는 아랑곳 않고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 없애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했다. 그러자 병자는 빛을 발하면서 ‘나는 아촉불이다’라 말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황후는 놀라서 바라보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불교 도입에서 14세기까지의 불교사를 정비한 역사서 『원형석서(元亨釋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화는 역사가 되었고, 한센병 요양원의 이름으로 남았다.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고묘시(光明子)라는 이름을 가진 고묘황후의 아버지는 쇼무 천황의 아버지인 몬무(文武) 천황 옹립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어머니는 몬무 천황의 보모였다. 게다가 남편 쇼무 천황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와는 이복자매지간이었다. 이런 관계는 당시 흔한 것으로 특별한 화제꺼리도 아니지만, 여하튼 막강한 세력을 지닌 로열패밀리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고묘시는 황족이 아닌 집안의 사람으로 처음으로 황후가 된 인물이다.
고묘황후의 미담은 시욕설화만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시약원(施藥院)과 비전원(悲田院)을 설치했다. 723년 『부상약기(扶桑略記)』에 이 기록이 남아있다. 시약원은 병인을 치료하는 시설이고 비전원은 늙은이와 고아를 맡아서 보살피는 곳이다. 고묘황후는 직접 이곳을 찾아 병자를 어루만지고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조정은 전국에 약초재배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귀족을 위한 것이었고, 불교사원 역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으로 결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묘황후의 시약원과 비전원은 획기적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했다. 도읍의 가로수는 배고픈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복숭아와 배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헤이안시대가 되어서는, 당시 막강한 세력가로 성장한 후지와라씨(藤原氏)가 시약원 운영에 개입해서 물신양면 아끼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 역시 고묘황후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다.
이름답게 빛이 난다는 이름을 가진 고묘시는 황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욕설화가 만들어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법화사 본존 십일면관음상의 얼굴이 고묘황후를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황족출신이 아닌 황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았다. 일본역사상 천황가 출신이 아닌 집안의 자제로서 황후가 된 최초의 인물, 자신의 딸을 사상 유일 여성 황태자로 만든 인물이 고묘황후이다. 그러나 황후가 기억되는 것은 이런 사실 때문이 아니다. 천재지변, 천연두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시약원, 비전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구제 사업을 펼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선윤 백석예술대학교 외국어학부 겸임교수
syko@newsishealth.com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