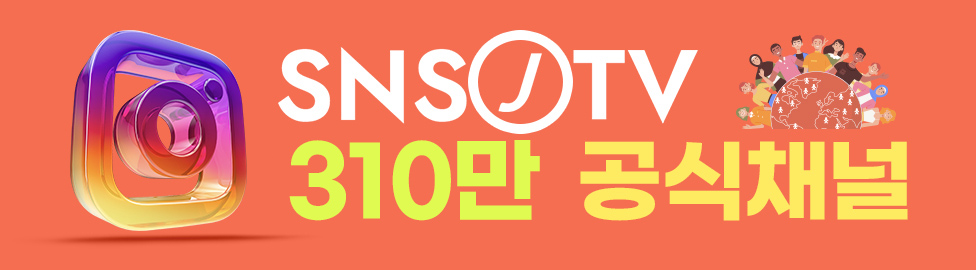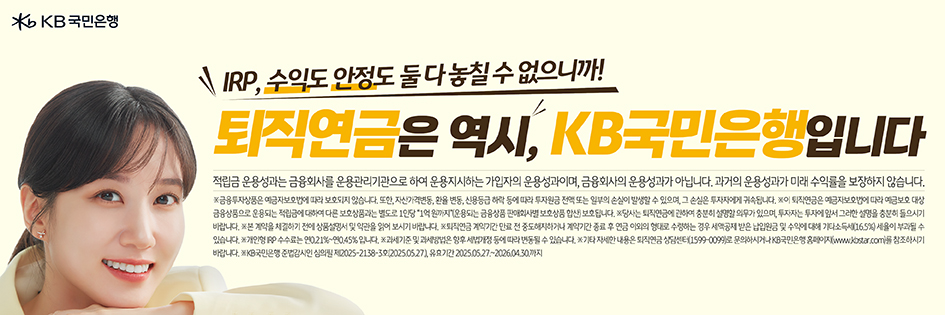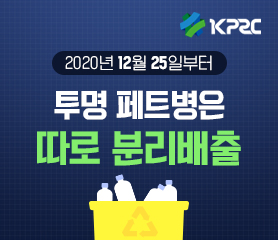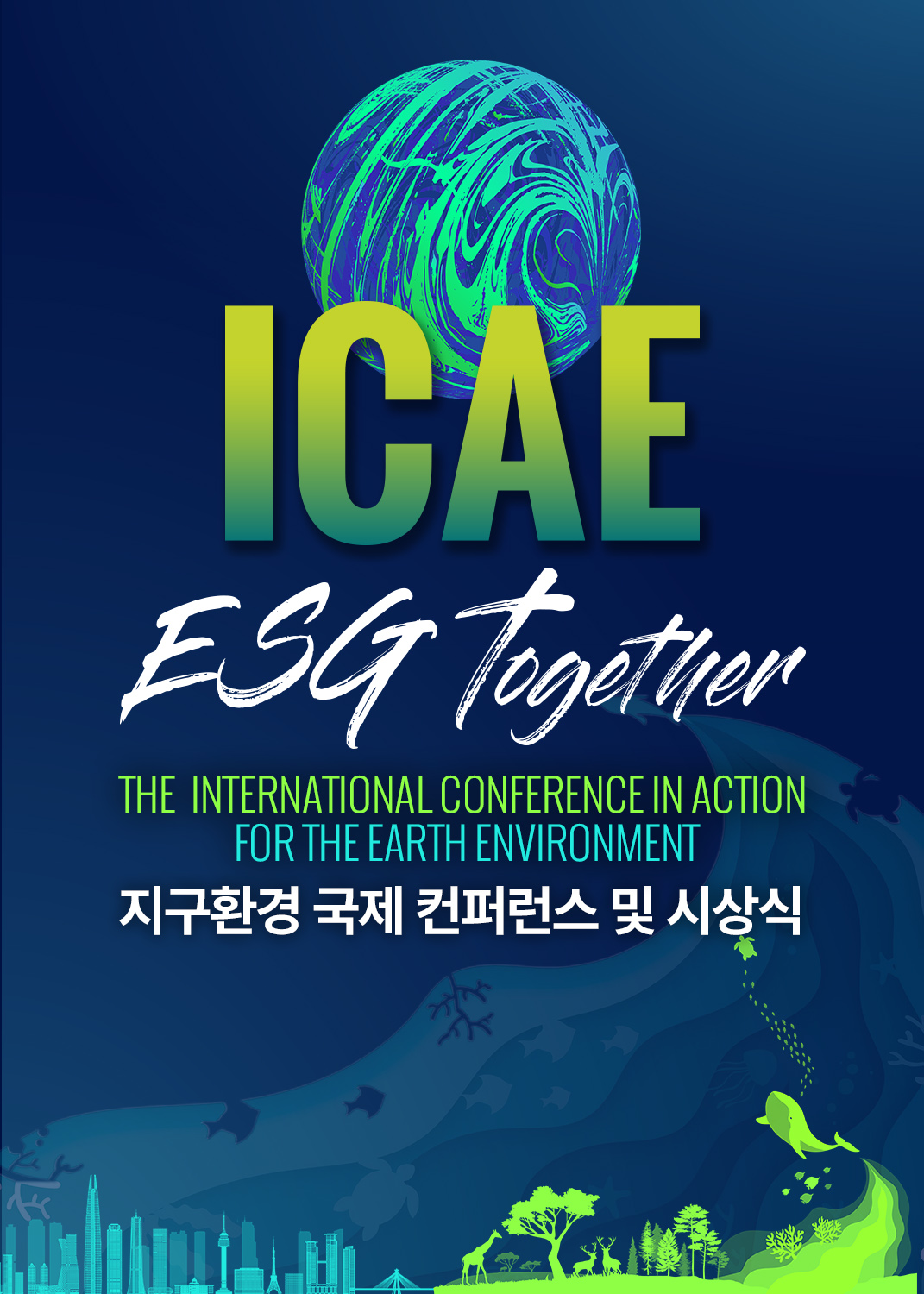글쓴이 / 최세만
사람은 사는 동안 남과의 인연과 우정사이에서 희열을 만끽하며, 생활의 진미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그것이 깨어지면 원망과 실망, 후회를 반복한다. 그때 수요 되는 것이 관용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다.
내가 수원A동에서 B동으로 이사 온지도 1년이 되어온다. A동 한곳의 셋집에서 7년 살다가 나왔다. 그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60대 주인집내외간하고도 친분을 두텁게 쌓았다 할 수 있다. 설 명절에는 사과를 박스 채로 들고 갔고, 중국에 갔다 올 때는 잣, 개암, 호두 같은 중국특산물을 팍팍 선물하기도 했다. 주인집도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우리를 잊지 않았다. 내외간은 두 번 있은 대선에서도 모두 문재인 후보를 찍었는데, ‘진보 성향’을 가진 우리 하고도 공통한 생각이 많았다. 주인집은 단독주택인데, 두 내외가 사는 3층을 빼고, 다섯 칸을 세놓았다. 주인집 나그네가 건설현장 간부로 있으면서 지은 집이다. 지금은 자가용을 끌고 운수 부업을 한다. 안주인은 시집 와서 단 하루도 출근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동네 치고는 잘 사는 부잣집이다.
큰 아들녀석이 새애기와 따로 집세 맡고 나가니, 나와 아내는 40만원의 집세(두 실 반)를 내는 큰집이 필요 없어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월세가 저렴한 26만원 원룸을 말해 두었다. 남들은 전세를 내고 원룸, 투룸도 산다고 법석대고 있는데, 셋방살이에서 ‘해방’ 되지 못 하니 ‘못난 놈’인 것은 틀림없다. 중국에 아파트 한 채 사놓고, 큰 아들녀석이 3천만원짜리 새 차를 덜컥 갔다 놓는 바람에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돈이 조금 적은 원룸셋방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달랑 나 눕는 바람에 처음 약속은 깨졌다. 이유인 즉 주인집내외간이 이렇게 좋은데, 차마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그것도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 말을 하니 말이다. 천성이 어질고 정이 많은 여자다. 그러다가 20일이 지나서 다시 원룸으로 나가자고 했다. 나도 적극 동조해 나섰다.
아내가 주인집 사모님(셋집에 있으면서 사모님이라 했음) 보고 말했다. “아무래도 나가야 하겠어요. 우리 살던 이 집이, 세 맡을 사람이 오면 떠나겠어요.” “아니, 원룸을 결정했으면 내일이라도 떠나세요. 우리도 이 집을 도배한 후 세 맡을 사람 찾겠어요.” 이날이 바로 7년 전 세 맡은 그 날이다. 사모님이 돌아간 후 나와 아내는 참 착한 주인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짐을 꾸렸다. 안 쓰는 두 개 옷장은 스티커를 붙여서 길가에 내놓았다. 아침 9시, 개인용달차로 두 번에 짐을 다 실었다. 아내가 뒷수습도 하고, 보증금 4백만원을 받아오느라고 좀 늦었다. 뒤에 온 아내가 얼굴이 파김치가 되었다. 절대로 피로에 쌓여 그런 건 같지는 않았다. 갑자기 충격으로 받은 상심에서 오는 그런 표정이다. 좀 지나 아내가 힘없이 입을 열었다.
“사모님이 보증금에서 한 달 집세를 떼 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천천히 이사 했던걸 그랬어요. 이렇게 바쁘게 말이예요~”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그래도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한달 월세를 떼내는 법이 어디 있담? 우리가 또 셋집 주인이 나타나면 이사하겠다고 분명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고런 돈 가지고 다툴 생각은 없었다. 이튿날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집 가서 전력측정기를 보고 한전에 갔다. 소모 전기가 1만7천원인데 돌아와서 2만원을 주인께 드렸다. 사모님은 내가 쓰던 책장에도 스티커를 붙여 놔라 했다. 나는 동사무소에 달려 가 3천원을 주고 스티커를 사서 붙여놓았다. 집에서 나갈 때 주인집 나그네는 “앞으로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요.” 하는 것이였다. 나는 ‘머쓱한’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 두 집은 원래 ‘인연’이란 것이 있었을 까.)
아내는 지친 마음으로 이사한 이튿날부터 출근했다. 연 며칠 피곤기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일에서 오는 피로보다는 집주인의 처사에 심신(心身)이 더 괴롭다고 말했다. 아내는 한국에서 마음 착한 이런 셋집 주인과의 좋은 인연도 드물다고 자주 말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인연’이라 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돈이 그 인연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서글펐다. 믿었던 것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다. 주위 한국 식당 아줌마들도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한 달 집세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있지도 않은 한달 집세를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흥분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곤란한 시기에도 돈 가지고는 인색하지 않았다. 한국 수속에 돈도 떼우고, 집도 떼우고 6년을 셋집 맡고 살 때 일이다. 5년만에 집주인(汉族)이 매달 집세 260위안(한국 돈5만원)에서 300위안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나와 아내는 쾌히 응낙했다. 이듬해 가서 한계도(3개월)에 일천 위안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그대로 내라고 했다. 나는 반년만 있으면 떠나지만 일천 위안을 준다고 대답했다. 후에 셋집 주인 (화물기차기사)이 “저 최씨는 돈은 많지 않는데 쩨쩨하지 않다.” 고 이웃집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고 한다.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월세가 안 오를 리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당시 나의 생각이었다.
중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없어도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인성 교육을 받아왔다. ‘자본 사회’资本社会는 분명히 인간이 중심에 있지 않다. 중심에 있는 것은 자본- 즉 돈이다. (절대적이라고 안 봄) 그러니 표면상으로 인간관계가 윤활하다가도 일단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보다는 돈 쪽으로 기울게 돼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18대 대선이 끝난 후, 샛터민 친구가 내 집으로 놀러 왔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냐고 물었다. 원래 북한(조선) 사람이니 문재인을 찍었겠다고 짐작했다. 그런데 박근혜를 찍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박근혜를 찍어야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이다. 그래야 북조선도 도와 줄 수 있지 않는 가고 했다. ‘진보’가 집정하면 못 살고, ‘보수’가 집정하면 잘 산다는 ‘억지’가 샛터민들한테도 각인되어 있었다. ‘자본 사회’에 와서는 누구나 돈을 우선으로 한다는 도리도 더 깨닫게 되었다.
돈을 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돈 의식’도 따라 가야 한다. A동 셋집은 우리가 처음 들 때, 원래 월세에 3만원을 더 붙인 후로는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 주인집에게는 고마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돈을 더 올린다고 해도 ‘억울’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우리 부부다. 실지로 두 집이 서로 돈 가치를 따졌다면 그처럼 좋은 ‘인연’이 있을 수 없었다. 그때 인연은 돈의 가치를 초월한 인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연이 더 좋은 ‘행운’의 발단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인연’이었다.
그런 인연이 속절없이 쓰러졌다. 허나 너그러운 마음과 포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언제 가는 진짜로 더 새로운, 더 마음 짠한 인연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다고 믿는다.